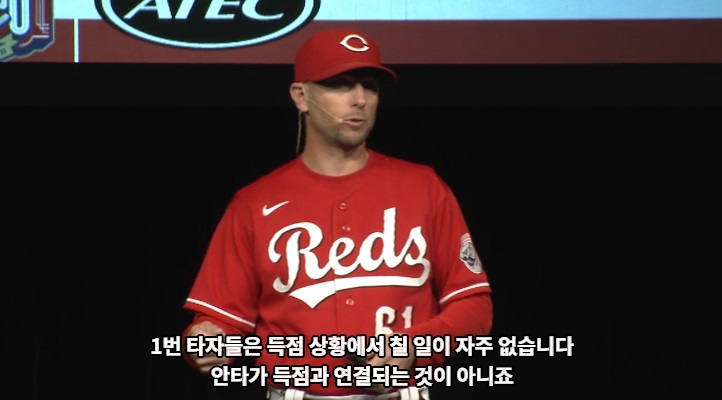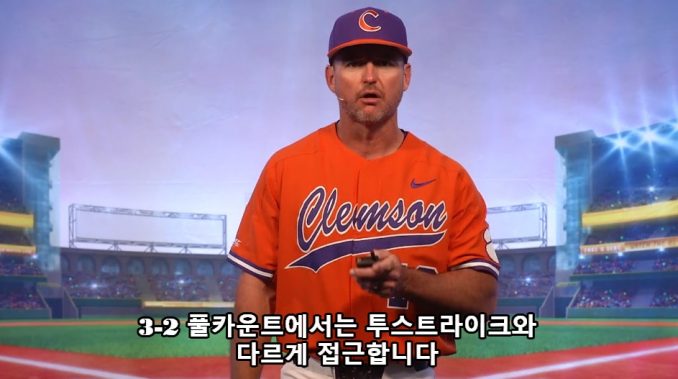스타 영어강사, ML 스카우트 되다
선수 출신이 아닌 스카우트,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출처 : 베이스볼긱)
스타 영어강사, ML 스카우트 되다
고교야구 대회가 열리는 목동구장 본부석에는 비치 파라솔이 여러 개 서 있다. 피서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왠지 야구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검게 그을린 얼굴의 사람들이 경기를 보면서 펜을 들고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다. 프로야구 스카우트들이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간이 선풍기와 낚시 모자, 팔토시는 필수품이다. 길게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땡볕 아래서 경기를 지켜봐야 한다. 그래도 크게 뜬 두 눈만큼은 누구보다 빛난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경기장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다양한 각도에서 선수를 체크한다. 수첩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적은 선수 정보가 빼곡하다.
국내 구단 스카우트들이 팀별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이에 군데군데 외국인 스카우트도 눈에 띈다. 메이저리그 구단 로고가 선명한 옷을 입은 한국인들도 있다. 오클랜드의 김현섭(44) 스카우트도 그들 중 한 명이다.

김현섭 스카우트의 이력은 특이하다. 올해로 마흔 넷. 스카우트가 된 지는 햇수로 7년이 됐다. 그는 경희대 재학 시절 미국 유학을 떠났다. 대학에서 호텔 경영과 회계를 공부했다.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대학 졸업 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했다. 원래는 스포츠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집안일로 귀국을 선택했다.
집안 일이 해결될 때까지 잠깐 한국에 머무를 요량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길어졌다. 일을 해야 했다. 영어 강사를 시작했다.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 법한 학원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쳤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누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다”며 “새벽반 수업을 했기 때문에 낮 12시 정도면 일이 끝났다. 남는 시간에는 주로 아마야구를 보러 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야구를 좋아했다. 프로야구보다는 아마야구에 흥미를 가졌다. 경기를 자주 보다보니 보는 눈도 생겼다. 야구장을 찾은 골수팬들과도 친분을 쌓게 됐다. 우연한 기회에 경기장에서 만난 오클랜드의 대만 지역 스카우트와도 국내 아마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았다. 필요한 정보를 대신 수집해 전달해주기도 했다. 그는 “당시에도 스카우트 일을 하게 될지는 몰랐다”고 했다.
타이밍이 좋았다. 그즈음 오클랜드는 아시아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2008년 대만 지역 스카우트가 김 스카운트를 추천해줬고, 오클랜드와 함께 일을 하게 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스카우트 스쿨’에 다녀온 뒤 본격적인 업무를 맡았다. 한국 선수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팀이 필요한 선수를 추천하는 일이었다.
◇비선수 출신 스카우트
오클랜드는 남미와 한국, 대만, 네덜란드 등지에 국제 담당 스카우트를 파견하고 있다. 대부분 혼자 움직인다. 다른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들은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이자 경쟁자다. 모든 일이 그렇듯, 맨땅의 헤딩이 계속됐다. 그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었고, 특히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흔한 연줄 하나 없었다.
국내 구단 스카우트는 100% 야구 선수 출신이 한다. 하지만 미국에선 30% 정도가 비야구인 출신 스카우트다. 그를 지켜본 이치훈 에이전트는 “비록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경험이 충분히 쌓였고, 이제 스카우트로서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라고 했다. 김현섭 스카우트는 “야구인이 아니라고 해서 스카우트 일을 못할 건 없다. 오히려 선수를 잘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야구가 어려운 전문 지식을 요하는 ‘학문’이라면 진입 자체가 쉽지 않겠지만, 최근에는 야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직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한다. 그는 “내가 선택한 선수가 메이저리그 무대에 진출하게 되면 또 다른 평가가 내려질 일이다.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했다.
국내 프로구단 입장에서는 국내 아마추어 선수가 외국에 진출한다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국내 아마야구 경기장에 등장한 초창기에는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단다. 하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아졌다. 김 스카우트는 “우리(메이저리그 스카우트)는 관찰 중인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않으면 경기를 다 보지 않고 돌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 스카우트 분들은 경기 끝까지 모든 선수를 살펴봐야 한다. 정말 고생이 많다”고 했다.
◇”스카우트는 멋진 직업”
김현섭 스카우트의 첫 번째 성공작은 2011년 야탑고를 졸업한 김성민이다. 김현섭 스카우트는 “(김)성민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009년 봉황대기에서 광주일고 유창식(현 한화)을 상대로 때린 홈런이 인상적이었다”며 “포수로서 어깨가 좋고, 송구 동작도 부드럽다. 타격도 괜찮다. 올해 루키리그에서 뛰다 싱글A에 올라갔다. 내가 선발한 선수여서가 아니라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선수 가운데는 가장 먼저 빅리그에 오를 재목”이라고 했다.
오클랜드는 김성민에게 계약금 51만 달러(5억 2000만원)를 안겼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당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아마야구 선수들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액수였다. 김현섭 스카우트는 “오클랜드 구단이 알다시피 젊은 선수들의 육성에 관심이 많다. 그렇다고 쉽게 돈을 쓰는 구단도 아니다. 신중하게 선택한 선수인 만큼 앞으로 기회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사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는 밖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그다지 화려한 직업은 아니다.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개 연간 3만5000달러(3500만원)~5만 달러(5000만원)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김현섭 스카우트 역시 영어 강사 시절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는단다. 다음달에는 5년간 연애한 여자 친구와의 결혼도 앞두고 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스카우트는 한 번 꼭 해볼 만한, 또 추천할 만한 멋진 직업”이라고 했다.
스카우트는 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스카우트로서 선수의 숨은 가치를 찾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계약까지 이르는 과정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선수가 빅리그에 올라 팀에 필요한 선수로 성장했을 때의 보람은 크다.
오클랜드는 현재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선두는 물론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짠돌이’ 구단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유망주를 내주고 연봉이 높은 에이스 투수(사마자)를 영입할 만큼 우승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는 팀이 우승을 하면 구단 전직원들에게 우승 반지를 준다. 우승 반지를 받으면 멋있게 한 턱 쏘겠다. 그런 게 보람 아니겠나”라며 환하게 웃어보였다.
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