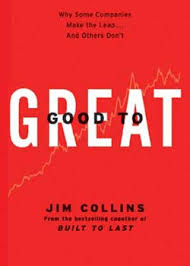‘아는 사람’의 덫
이번 주 야구친구에 올린 글입니다.작년 저의 아들이 전국대회에서 한 지방팀의 선수와 친근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서울팀도 아닌데 그 친구를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았죠. “우린 왠만하면 다 알아”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지나간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아는 사람’의 덫
얼마 전 타계하신 신영복 선생님께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다. 윗집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한동안 신경이 쓰였는데 어느날 집 앞 놀이터에서 그 아이를 만나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후로는 아이가 뛰어다녀도 그다지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떠올리면서 미소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는 아이가 뛰면 덜 시끄럽다’는 것이 신영복 선생님의 메시지다.
사람의 마음은 아는 사람에 대해 호의적이고 관대하다. 오랜 친구의 부탁은 거절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면 화가 나서 따져 물을 일도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일도 다반사다. 신영복 선생님의 메시지는 ‘아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팀의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의 야구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자주 얼굴을 보며 성장해 간다. 초등학교 때는 홈스테이 등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고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전지훈련을 함께 하며 여러 팀의 선수들이 우정을 쌓아간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경기에서도 베이스에 나간 주자와 야수들이 농담을 주고 받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선수, 지도자, 행정가로 몸담게 된 야구계는 소위 말해 ‘아는 사람’으로 가득차게 된다.
제도나 시스템에 변화를 촉구한다는 것은 그 시스템 속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를 어느정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이 나타나는 야구계에서 이런 작업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내가 문제를 제기하면 내 친구, 선후배가 피해를 본다’는 인식은 손과 발을 얼어붙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야구인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자리에서는 많은 문제들을 쏟아내지만 정작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다. 비시즌인 이맘때면 해마다 반복되며 쏟아져 나오는 야구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야구도, 야구인도 잘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