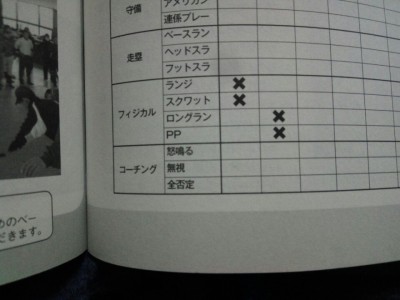한계까지 몸을 혹사시켜야 발전한다는 믿음
일간스포츠 최민규 기자님의 페이스북 포스팅글과 기사를 옮겨왔습니다.
“전병두가 하루에 공 1,000개를 던졌다”는 말에 가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긴, 전병두 뿐만은 아닙니다. 심수창도 야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공 1,000개를 던졌다는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전병두에게 남은 건 두 시즌의 좋은 투구와 4년의 재활입니다.
포크볼과 ‘마사카리 투법’으로 유명했던 왕년의 롯데 오리온스 에이스 무라타 초지는 1982년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는 ‘남자라면 팔이 떨어져나갈 때까지 던져야 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처음 재활 방법으로 선택했던 건 ‘한계가 올 때까지 콘크리트벽에 공 던지기’였습니다. 다음으론 마사지, 침, 전기충격, 참선, 뱀껍질 두르기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1985년 재기에 성공해 40살까지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프랭크 조브 박사로부터 받았던 ‘토미 존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이후 무라타에게 가장 어려웠던 건 “공을 많이 던지지 말라”는 조브 박사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선수는 자기 한계까지 몸을 혹사시켜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생각의 신봉자인 한 감독은 의문을 표하는 젊은 트레이너에게 “비상식 속에 상식이 있다는 걸 왜 깨우치지 못하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간혹 혹사를 이겨내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가 있다면, ‘비상식 속의 상식’이 아니라 ‘돌연변이’, 혹은 ‘통계적 아웃라이어’라고 해야 합니다. 야구 감독들은 스포츠의학자들의 권고에 좀 더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