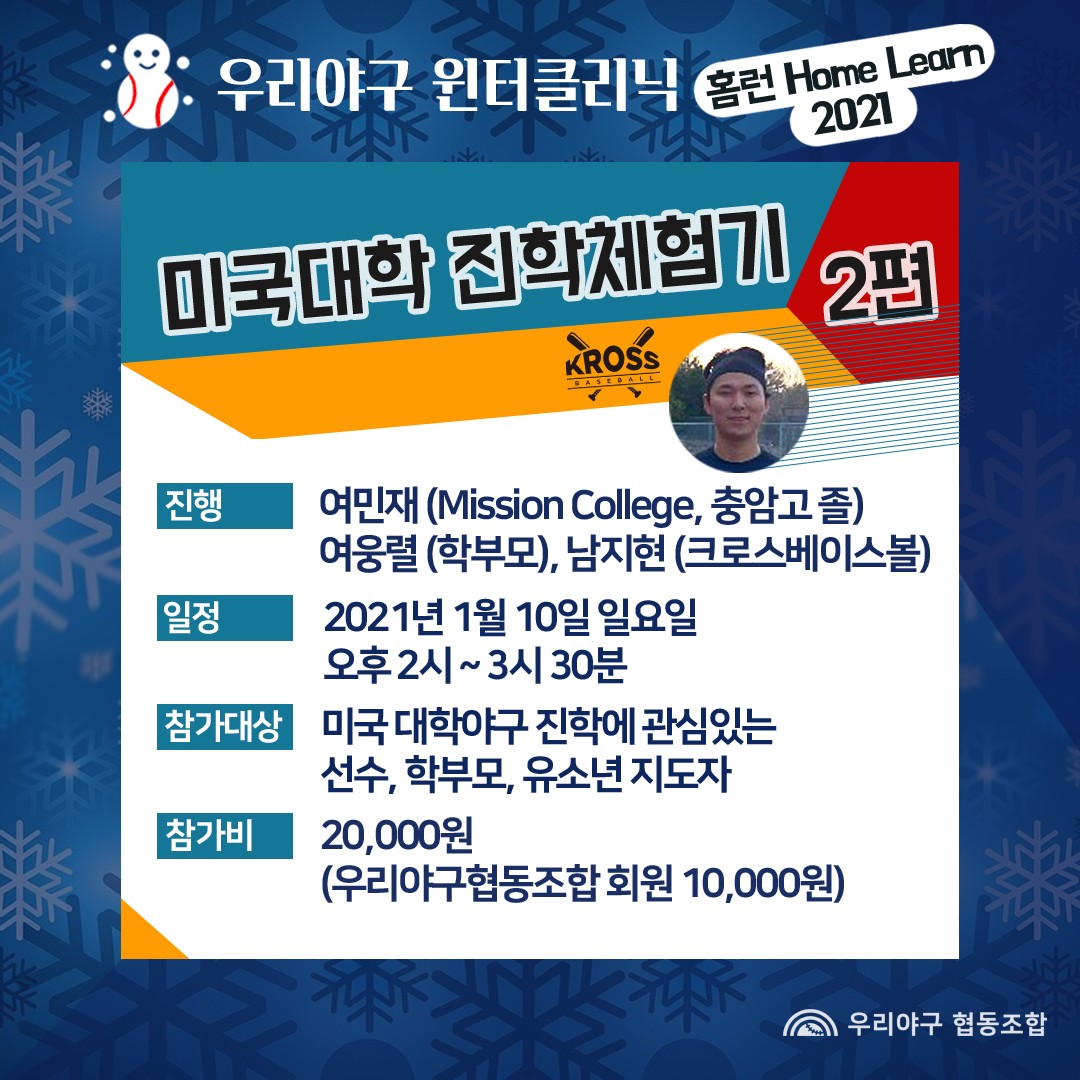풍성한 ‘야구언어’의 부재에 대하여
이곳 회원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데이터인플레이 신동윤 대표님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퍼왔습니다. 글의 서두에 언급된 이야기는 제가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야구해설에 대한 아쉬움은 제가 언제 한번 따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전 어떤 분의 포스팅을 공유했다. 이런 내용이다.
”5점차 리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8회말 투아웃에 1군 데뷔 첫 등판한 투수가 연속 볼넷을 주었다고 치자.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이때 해설자나 팬들이,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면 1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라든가, 5점차 리드 상황에서 그것도 주자없이 투아웃 상황에서 어렵게 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든가, 대범하게 던질 필요가 있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다. 아니 세상살이를 모르는 이야기다.
최소한 해설자라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 투수는 언제 몇 라운드에서 드래프트 되어 몇 년 동안 퓨처스 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내어 언제 1군에 콜업되었는지, 프로에서 첫 타자를 만난 투수의 마음이 어떤지, 포수의 미트는 보이는지, 포볼이지만 그 과정의 구속은 어땠는지, 주무기는 무엇인데 그 구종을 던질 수 있었는지, 밸런스는 어떤지, 그리고 투수가 한 명의 타자를 처리하는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말해야 한다. “
머리 속을 자꾸 맴돈다. 어떤 분은 여기서 배려와 존중을 읽었을 것이다. 나는 [야구언어]의 현재를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야구의 위기를 논한다. 경기력, 저변, 정신상태… 뭐 다 좋다. 나는 야구언어의 부재를 느낀다.
컨텐츠로서 야구는 당연하게도 시대, 사회의 [야구언어]를 통해서 “만” 향유된다. 그게 미디어든 술자리 한담이든 지금의 내 페북질이든.
그라운드에서 공을 때리고 쫓는 물리적 행위 말고, 야구와 야구선수, 야구팀, 팬 사이의 상호관계로 본다면 — 그렇다. 야구언어가 없으면 야구도 없다.
나는 지금 시대 우리의 야구언어가 80년대 하-허 투탑 해설가에게 크게 빚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진 야구언어는 좀 달랐을 것이다. 그후 30년 우리의 야구언어는 얼마나 발전했나. 그닥. 별로.
세이버메트릭스가 촉발시킨 야구통계의 혁신은 야구언어를 변화시킨 중요한 계기다. 누군가는 거기에 열광하고 누군가는 마뜩찮게 여긴다. 이쪽도 저쪽도 옳다. 왜냐하면, 야구언어의 관점에서 볼때 그것의 가치는 야구를 더 재밌고 흥분되게 만드느냐 아니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야구언어가 목표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라운드 안의 치열한 싸움을 팬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이다. 0.4초의 승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뜬금없이 볼질을 하며 경기를 불태우는 마운드 위 투수의 망연한 표정 뿐이다. 어이없는 떨공에 헛스윙하며 기회를 날려버린 고개 떨군 타자의 뒤통수 뿐이다.
훈련장에서 투수들이 던지는 공을 지켜보면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진다. 프로연차나 시즌성적을 막론하고 거의 다 그렇다. 폭탄같고 칼날같다. 그들이 실전 마운드에서 그 공을 못던지는 걸까? 그런 것도 없진 않겠지만 어떤 타자들이 그런 공을 별거 아닌듯 외야 멀리 날려버린다는게 휠씬 더 큰 차이다.
그런데 우리 야구언어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뤄왔나. 점수가 많이나면 투수들을 바보취급하고 점수가 안나면 타자들을 바보 취급한다. 수비실책을 한 선수의 표정을 길게 쫒으며 자, 모여서 저 놈을 조롱하고 욕해봅시다 선동한다.
착하게 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싸움을, 맨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플레이를 풀어 전달해야 하는 야구언어의 마땅한 의무를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그 의무를 해내지 못해온 야구언어의 부재를 한탄하는 것 뿐이다.
지난 20년 동안 소위 네임드 야구인들은 끊임없이 야구를 디스해왔다. 야구의 수준이 떨어졌고 선수들의 몸값이 거품이고 등등. 이기고 진 결과를 비평하고 훈계하는 것 말고, 그들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맨눈에 보이지 않는 정밀한 승부를 표현하고 전달할 언어가 얼마나 있었나.
내가 세이버메트릭스에 매료되고 내가 트래킹데이터에 환호했던 것은 — 지금 그라운드 안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게 엿볼 수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새롭고 환상적인 야구언어였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태생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더구나 더 많은 경우, 야구통계는 비밀스러운 승부를 들여다보는 현미경으로가 아니라 또다른 못된 권위가 되어 선수들을 줄세우고 비평하는데 쓰이고 있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야구언어, 무엇에 관해 말하고 그것을 어떤 표현으로 전달하고…에 대해 얼마나 달라졌나 생각해보면 된다. 더 많은 중계,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영상소스가 있지만 야구언어는 별반 달라진게 없다. 세상이 변했는데 언어가 변하지 않았다면 거의 확실히 뒤쳐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야구언어환경은 소셜미디어와 같다. 전 경기 생중계는 스포츠미디어의 필터 없이 팬들이 직접 야구와 닿게 해준다. 야구통계는 소위 선출이 아니라도 선수와 플레이를 평가할 근거와 명분을 만들어줬다. 인사이더가 독점하던 언어를 해방시켰다.
하지만 소셜미디어가 만든 변화가 그렇듯, 새로운 야구언어환경에서 파괴된 권위 대신 새로운 소통방법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조롱과 비아냥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다.
별스러운 기책을 고심할것도 없다. 프로 첫 등판에 볼질하다 침몰하는 젊은 투수에 대해, 결과를 두고 평하는 깝깝한 훈계 말고, 저 투수의 배경과 저 투수의 도전을 말할 수 있는 언어라는게 뭐 그리 별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나. 세이버메트릭스든 트레킹데이터든 역시 거기서 자기 할일이 있을 것이고.
다시 말하지만 착하게 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라운드 안의 싸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싸움이 더이상 무가치해진다면 기꺼이 야구의 소멸을 받아들어야 하겠지. 하지만 야구언어가 영혼을 모아 십수년 동안 야구를 디스해서 야구가 망하면 그건 너무 가슴아픈 일이 아닌가.
야구언어 환경은 소셜미디어의 맥락과 결국 같다. 권위와 전통은 계속해서 파괴될 것이다. 관건은 새로운 언어가 거기서 태어날 수있을거냐 아니냐다.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소셜미디어에서 그랬듯 제도권 미디어도 아니고 kbo도 아니고 구단도 아니다. 그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판이 그런 판이 아니라서다. 누군가 답을 찾는다면 그건 소위 집단지성이라 불리는 그것 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야구언어 환경은 꽉 막혀있다. 언어의 재료들, 영상도 데이터도 접근성이 심하게 나쁘다.
위기를 논하며 무언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난 [야구언어의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걸 위한 최소한의 전제가 [오픈소스]다. 될지 안될지 누가 알까마는, 된다면 거기 밖에 길이 없다.
학교야구팀이 몇개 더 생긴다고 야구 저변이 깊어지지 않는다. 야구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 그렇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