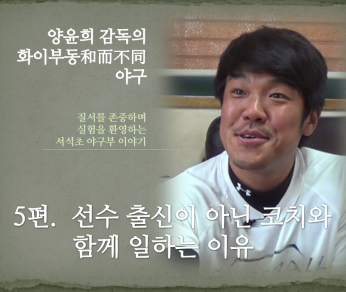한-일 고교야구의 빛과 그림자
[체육시민연대 금요칼럼 87호]
한-일 고교야구의 빛과 그림자
-고광헌 (한림대교수)
팔월 말에 끝난 일본 고시엔야구대회에서 사이타마현 대표 하나사키 토구하루고를 창단 이래 첫 우승으로 이끈 이와이 다카시 감독은 세계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가 생각하는 선수상은 ‘생각하고’ ‘상상하며’ ‘스스로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고시엔대회 우승기엔 그의 이런 스포츠철학이 배어있다. 야구장은 또 하나의 교실이고, 그에게는 이 교실마저 좁다.
이와이 감독은 고시엔대회가 한창이던 8월 15일 선수단을 이끌고 오사카 ‘평화기념자료관’을 찾았다. 이 자료관은 오사카시가 일본의 2차 대전 패전을 교훈삼아 건립한 기념관. “선수들이 야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박한 것 같은데, 음미할수록 가슴을 뛰게 한다. 몽글몽글한 희망이 꿈틀거린다. 야구에서 배운 미덕이 평화와 만나는 순간이다.
지난해에는 ‘피스오사카’엘 갔다. “선수들이 전쟁의 참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평화 속에서 야구를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역사교사 야구감독의 마음이 담겨있다. 우경화로 치닫는 아베정권 아래서 낮은 목소리로 평화를 외치는 양심세력의 목소리를 닮았다. 평화는 저처럼 작고 소박한 것에 대한 지지와 존중에서 나온다.
고교야구에 대한 미디어의 ‘예우’는 윤리적 책임과 교육적인 배려가 깔려있다. 아마추어에 대한 존중과 방송의 공익성이 만난다. <NHK>와 <교육방송> <위성방송> <NHK 라디오>까지 공영방송들이 적극적이다. 이들 방송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쉬지 않고 경기를 중계했다. <교육방송>이 더 적극적이었다.
고시엔대회와 관련한 서사를 발굴해내는 <아사히신문>의 보도는 단연 돋보였다. 솔직히 부러웠다. 아사히는 스포츠 세계가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보물창고임을 보여줬다. 이 신문은 기획, 특집을 통해 고시엔 1백년사에 명멸한 수많은 인물과 사건을 추적하고 발굴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다뤘다.
그 가운데서도 2차 대전 전에 대회에 참여했으나, 징병과 전쟁을 피하지 못하고 희생된 선수들을 호명해 공적기억화 하는 작업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아사히신문>은 1933년 대회에 출전해 결승전에서 25회까지 연장전을 벌인 주쿄상고와 아카시고간의 경기에 출전한 선수 중에는 나카타 마쓰시타와 가토노부오 등 여덟 명이나 희생됐다고 썼다.
1941년 미국이 참전하자 일제는 야구를 ‘적성스포츠’로 규정했다. “미국의 국기는 야구다. 야구를 하면서 적개심을 고양 할 수 없다.” 야구금지령을 내린 군국주의 정부의 궤변이었다. 반론을 편 사람도 전쟁에 끌려간 야구선수 출신이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전쟁이지 야구가 아니다.” 중국의 전선에 휩쓸려 간 마쓰이는 이런 취지의 글이 담긴 엽서를 <스모와 야구> 편집장 이케다 츠네오에게 보냈다. 하지만 그는 얼마 뒤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한다. 스포츠를 통해 삶의 가치와 철학을 익힌 사람만이 낼 수 있던 용기였다.
일본 고교야구를 보던 눈길을 우리 안으로 돌리니 턱턱 숨이 막힌다. 서울 충암고의 에이스는 “3일 동안 3백34개의 공을 던지고, 마지막엔 이틀 연속 2백45개를 뿌렸다”고 한다. 야구전문가들과 스포츠저널들은 비판보다는 철벽어깨라며 치켜세운다. 선수인권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가학성 논평이다. 지도자의 이성과 윤리적 책임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혹사는 선수의 영육에 문신과 같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
경기도의 한 사립고 야구코치는 별칭이 터미네이터이다. 그는 툭 하면 선수들을 때린다. 허벅지는 짙은 보라색으로 물들고, 폭력에 대한 공포심은 맞지 않는 선수들마저 죽을 각오로 도망치게 만든다. ‘야구교실’은 폭력과 욕설 속에서 근육이 끊어지고 피가 솟는 고문실이다. 대물림된 폭력은 선배의 후배 폭행으로 전염된다. 팔씨름을 빙자해 선수에게 돈을 뜯어내다니 조폭이 따로 없다.
이 정도면 선수들의 심성과 팀을 황폐화시키고 구성원을 노예적 관계의 포로로 만든다. 매 맞는 선수들도, 이를 폭로하는 미디어들도 비명을 지르는 듯하다. 한국야구는 학생선수들의 영혼과 육신의 근육을 키우는데 실패했다. 폭력 앞에 무방비 상태의 선수들과, 그들의 가족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지도자들과 무기력하고 부패한 학교와 협회들이 인권부재 속에서 정지한 시간의 감옥에 갇혀 있다.
대한체육회와 체육기관들과 학교는 반인권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적극적이지 않다. 스포츠에서 성공은 선수에 대한 존중과 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고, 그 길라잡이는 오직 윤리적 책임을 내면화한 지도자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지도자는 선수를 중심에 세우고, 그들을 자유롭고 차별적인 창의와 상상의 세계로 지도하고 안내한다.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 스포츠정책은 인간적 존엄과 사회적 예우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구현해낼 수 있는 지도자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급변침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