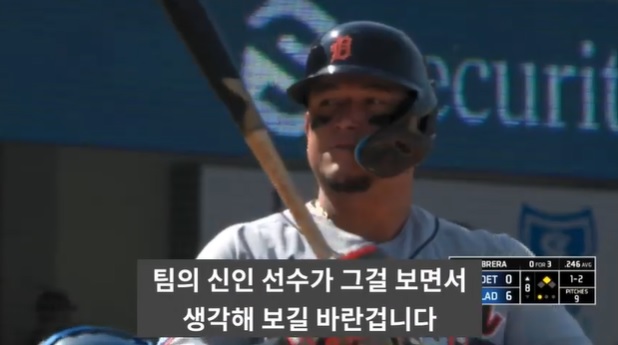슬램덩크 안감독의 작전타임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보다보니 영화관을 찾을 일이 확연히 줄어들었는데요. 모처럼 가족들과 뜻이 맞아서 영화관을 찾아 슬램덩크를 관람했습니다. 저희 세대의 스포츠를 좋아하는 많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슬램덩크에 대한 팬덤이 저에게는 딱히 없습니다. 소설보다는 다큐를 더 좋아하는 기질 탓인지 슬램덩크의 스토리와 각각의 캐릭터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광스러운 분위기가 저에게는 상당히 낯선 편입니다. 사실 만화의 내용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윤대협이 어느 팀이었더라? 팀의 에이스가 서태웅이었나? 정대만이었나? 겨우 이 정도의 기억! 물론 만화책을 볼 당시에는 무척 재밌게 읽었던 감정은 남아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하얀 무채색의 배경에서 한 명씩 모습을 드러내며 등장하는 장면에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울컥하지? 묘한 감정이 휩싸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북산과 산왕의 경기 장면이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예전에 만화책을 한 장씩 넘기며 느꼈던 긴장과 스릴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기억이 감정과 함께 소환되는 과정이 저에게는 영화의 전개만큼이나 재미있었습니다.
슬램덩크를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명대사들 “감독님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저에게는 지금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입니다.” 어찌보면 뻔하고 오글거리는 말들도 무척 생동감있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설명보다 이야기가 필요하다!

누군가 저에게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어디였냐고 물으면 저는 안선생님의 말을 꼽고 싶습니다. 송태섭이 계속되는 압박수비 상황에서 연거푸 실수를 하며 점수차가 20점 가까이 벌어진 상황에서 안선생님은 작전타임을 부르고 선수들을 벤치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긴장하지 말라든지, 하던 대로 하면 된다든지, 일단 수비부터 집중하자든지 하는 주문 대신 “30초간 심호흡”을 시킵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만사를 스포츠코칭의 맥락에서 보는게 습관이 된 저에게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또렷이 남습니다.
뉴스레터 42호 코치라운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