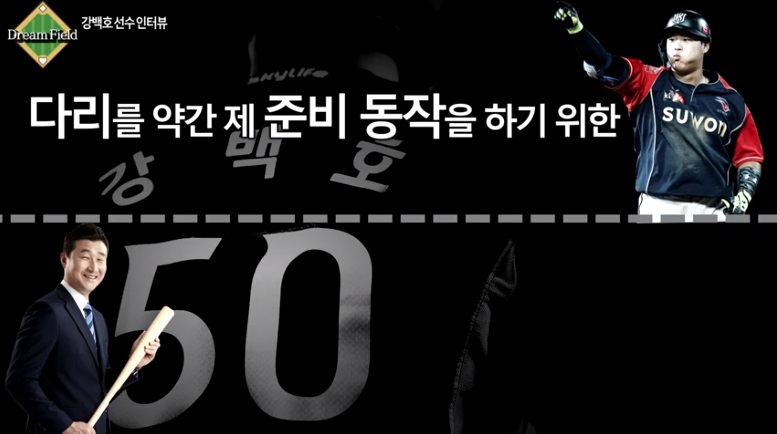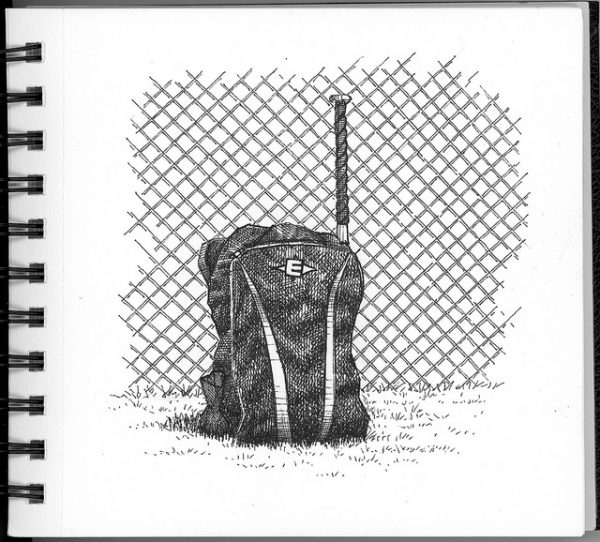‘언제나’ 라든지 ‘절대로’ 같은 것은 없다 (제리 와인스타인)
콜로라도 로키스 제리 와인스타인 코치의 인터뷰 기사 세 번째 꼭지입니다.
(지난글 보기)
타격의 메카닉이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타격 임팩트시에 있습니다. 컨택 지점에서 양손은 위와 아래를 봅니다. 뒷다리는 L자 모양을 하게 되구요. 앞다리는 단단하게 서있고, 머리와 눈은 컨택 지점을 바라봅니다. 컨택 지점은 90도이거나 90도에 가깝습니다. 오늘날의 선수들을 봐도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사각과 타구속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타자들은 항상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치고 싶어 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다저스의 스카우트였던 케니 마이어스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땅볼로는 장타를 만들 수 없어.”
60년 전에도 그 분은 공을 띄우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확실히 과학기술의 영향으로 피칭 로케이션이나 공을 골라내는 것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을 높게 던지다가 맞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게 던지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소화하시나요? 특히 선수육성과 관련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죠. 코치는 항상 (정보들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테스트해볼 지를 결정하는 것은 선수의 몫이죠. 물론 선수들 대부분은 실험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비밀 정보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변해왔죠. 예전에 행해진 방식이 오늘날에도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는 변화구와 하이 패스트볼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스타일이 과거로 돌아가면 잘 먹히지 않았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 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타자들은 삼진아웃에 대해 예전보다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자들은 마치 골프에서 드라이버로 멀리 보내기 내기를 하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예전에는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 내려고 했죠. 마치 7번 아이언으로 공을 홀 근처에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분석팀과 현장 사이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체인저>를 쓴 커티스 콘리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CSI 테크닉 – 증거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방식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수의 배트 스피드가 좋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좋은 타구를 날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면 바이오메카닉 전문가나 분석팀과 연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선수의 가동성, 회전력 및 회전 속도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선수는 스트렝쓰(힘)와 관련해서 신체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나 가동성과 관련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의도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젊은 선수들이 어린 시절에 ‘쉽고 편하게 던져. 그냥 타겟에 맞춰’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그 결과 그 선수는 그냥 쉽고 편안한 딜리버리와 느린 팔스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69마일 밖에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에 뛸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그 선수에게는 많은 잠재력이 숨어 있을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선수들과 함께 스윗스팟(타구가 멀리 날아가는 배트의 중심부, 최적의 지점을 상징)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나’ 라든지 ‘절대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선수에게)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 (끝)
번역 : Paul KIm 님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