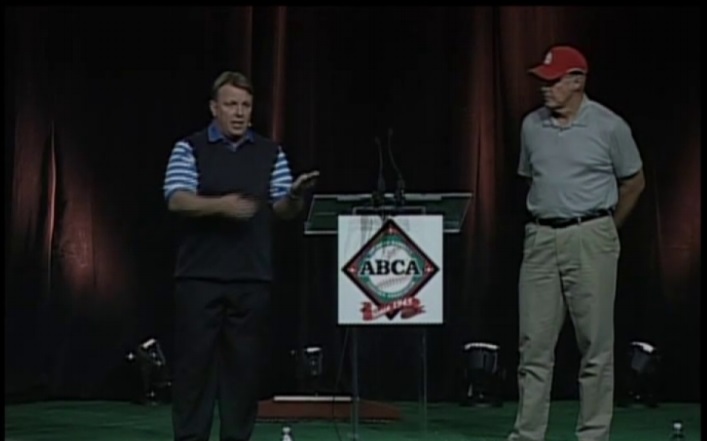해도 해도 도저히 안된다고 느껴질 때 (박용택)
어느 날인가 무심결에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놀랄 때가 있었다. 몸도 마음도 바닥에 쭉 깔려 일어날 수도 없다고 생각될 그때 밖으로 “아~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한참 전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야구를 그만두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도망갈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왜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을까?
절대 여기서 그냥 그만둘 수는 없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이었을까? 만약 야구를 그만둘 만큼 다치거나 큰 병에 걸린다면 모르겠지만 내 사전에 중도 포기는 없었다. 힘들어도 재미없어도 야구만큼 좋아하는 일, 야구만큼 오래오래 해도 지겹지 않은 일은 없었다. 그냥 야구는 내 운명이었다.

그러니 남들은 힘들면 ‘다 때려치우고 다른 일 찾아볼까? 혹은 아무도 모르는 데로 도망갈까?’ 생각할 때도 있다는데 나는 야구 안 하는 박용택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내가 야구를 그만둔다는 건 운명을 거슬러야 가능한 것이었기에 “죽고 싶다”는 말로 답답함을 표현했던 것 같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들었으면 가슴 철렁할 일이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힘들 때가 많았다.
노력이라면 누구에게 질 자신 없을 만큼 열심히 했고, 밤잠을 늘 설쳐가면서까지 야구를 공부했고, 더 나아지려고 끊임없이 연구했다. 훈련량도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만큼 많았고, 상대팀 분석도 더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그런데 누가 배트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고, 말 한마디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다.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나보고 어떻게 더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누군가가 벼랑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 같은데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렸던 것 같다.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도해보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내게 ‘죽고 싶다’라는 말은 나 죽을 만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느냐는 한숨이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다시 태어나야 하냐는 절규였다. 바닥을 쳤을 때 내가 별 짓을 다해도 어쩔 수 없다는 내 한계를 인정하는 말이기도 했다. 힘들 때는 그 상황보다 자꾸 잡념이 히트바이피치드볼처럼 몸과 마음을 사정없이 공격해 와서 더 아프다. 지난 타석에 대한 생각을 다 버리고 단순하게 들어섰더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발이 빨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체격 조건이 더 좋았더라면 이보다 장타를 때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은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헐거워지면 칼바람이나 세균처럼 주저없이 쳐들어와서 구석구석 두드려 팬다.

혼자 버티려고 하면 안된다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는 혼자 고민하지 않고 팀 멘탈 닥터를 찾아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것이 야구를 오래 할 수 있는 내 장점 중 하나이다. 야구가 안 될 때는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멘탈 닥터 뿐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코치님, 의사 선생님, 스승님, 선배를 찾아야 한다. 물론 내 몫인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하지만 해도 해도 안될 때는 버티기만 해선 안 된다. 분명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많지만, 안개나 먼지가 잔뜩 앞을 다 가려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가 분명 있다. 그때는 그 한 겹을 거둬내도록 도와주는 자동차 와이퍼 역할을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나약하거나 못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수십 년 운전을 한 베스트 드라이버라 하더라도 안전 운전을 도울 보조장치가 필요하고, 햇빛이 눈부실 때는 선글라스를 써야 하며, 고장 나면 자동차 정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다. 내 주변에 날 도울 수 있는 사람과 전문가나 환경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와 강함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버니 홀리데이, 피츠버그 파이러츠 멘탈 컨디셔닝 코디네이터)
‘내가 누군데 도움받으면 무시하지 않을까,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다고 소문내면 어쩌지?’ 이런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약자가 아니다. 상대는 다 알면서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오길 애타게 기다리던 적이 많았다. 그럴 때 내가 찾아가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마음을 다해 도우려고 애썼다. 벌어지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는 고민을 도와줄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는 게 우선 과제다.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요즘은 대출도 능력이고, ‘빚테크’라는 말이 있다고. 물질적으로 빌리는 것뿐 아니라 내 고민을 덜어주고 채워줄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도 능력이다. 언제나 받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을 빚이라 생각하고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고 고마워하며 그가 내게 도움을 원할 때 나도 마음을 다해 도와준다면 되는 것이다. 도움을 준 그에게만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후배든 동료든 다른 사람들이 내미는 손을 잡아주는 것도 빚을 갚는 것이라 믿는다.
글 : 박용택
박용택 위원의 책 <오늘도 택하겠습니다>의 내용 일부를 출판사의 허락을 구하고 우리야구 10호에 발췌소개한 글입니다.
우리야구 10호 구입은 우리야구 스토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