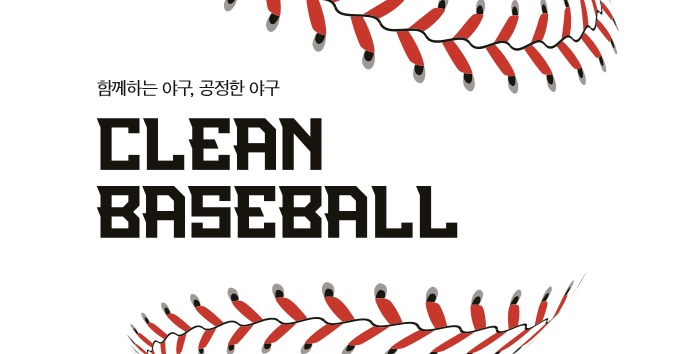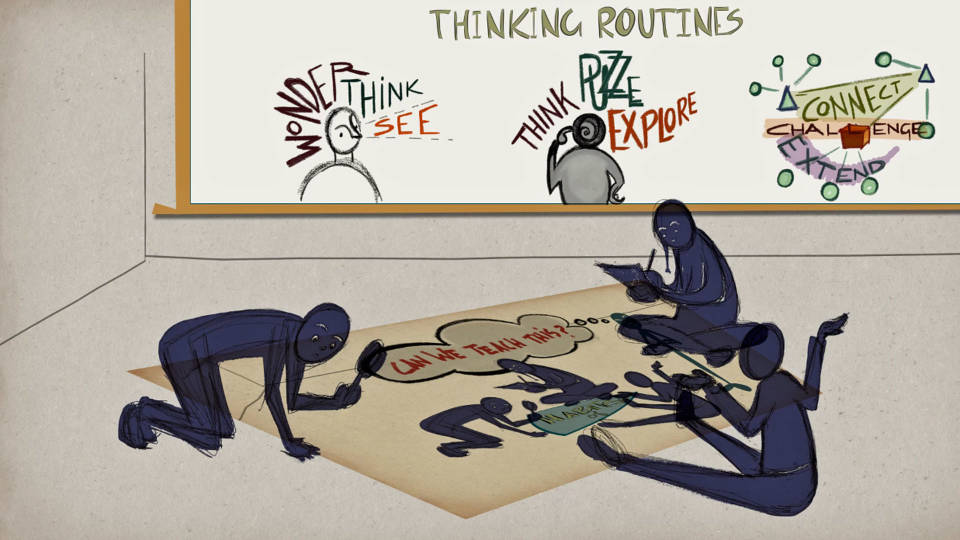감독이 심판에게 소리를 지르면
저도 예전 바비 콕스 감독이나 벅 쇼월터 감독이 심판에게 달려나가 거칠게 항의를 하다 퇴장당하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 의도가 분명히 보이니까요. 자신의 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과장된 액션이라는 것을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 모두 보면서 웃고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경기장에서 지도자분들이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이와는 좀 맥락이 다릅니다. 화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행동과 화에 사로잡혀 하는 행동은 대개 티가 나니까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면 심판에게 한바탕 쏟아붓고 덕아웃으로 돌아와서 “야. 비슷하면 쳐야지 가만히 서서 삼진을 당해? 00야”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감독이 심판에게 소리를 지르면”
(야구친구 http://www.yachin.co.kr/w/73/40)
지난 주말리그 경기 중 한 장면. 볼 판정에 불만을 품은 감독이 천천히 주심을 향해 다가온다. 처음에 조용히 시작된 대화는 점차 언성이 높아지고 코치와 부심들이 달려와 심판과 감독을 말리는 상황이 펼쳐진다. 프로야구였다면 퇴장명령이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얽힌 야구계의 온정주의는 심판으로 하여금 그러한 단호한 선택을 주저하게 만든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감독은 부하직원을 나무라는 직장상사처럼 계속 고함을 치고 주심의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이 관중석 저 멀리서도 느껴진다.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펼쳐진다. 기가 막히게 잘 맞은 타구가 상대팀의 글러브에 쏙 들어가 타자를 허탈하게 만든다. 완벽히 제구된 공이 방망이 끝에 맞으며 바가지 안타가 되어 투수를 맥빠지게 하는 일도 다반사다. 차라리 삼진을 당하거나 빗맞았다면 혼자만 죽었을텐데 너무 잘맞는 바람에 병살타가 되곤 하는 것이 야구다.
어린 선수들이 야구를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그러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순간적으로 끓어 오르는 억울함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바로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는 태도를 야구를 하며 익혀나간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자산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지도자가 보여주는 언행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선수들에게 롤모델이 된다. 감독이나 코치가 심판의 애매한 판정에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선수는 불운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를 비난하며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다음을 준비하는 태도를 익히게 된다. 어느 상황에서든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메시지도 자연스럽게 팀전체에 스며들게 된다. 또한 심판의 실수를 관대하게 대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게 된다. 누구나 실수를 하며, 실수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감독, 코치가 심판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그저 최선을 다하면 돼”라고 말하지만 막상 경기에서 졌을 때 선수들을 험악한 분위기로 나무라며 대한다면 선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지도자의 말을 믿지 않게 된다. 삼진을 먹고 들어왔을 때 일그러져 있는 감독, 코치의 표정을 보며 선수는 자신있게 치라는 주문에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아이들에게 훈련일지를 쓰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은 훈련일지를 쓰라는 지도자의 백 마디 지시가 아니라 직접 훈련일지를 쓰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좋은 코치는 경기를 이기게 만들지만 위대한 코치는 선수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는 말은 특히나 경기장이 곧 교실일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엘리트 야구부의 현실에서 더욱 절실한 메시지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