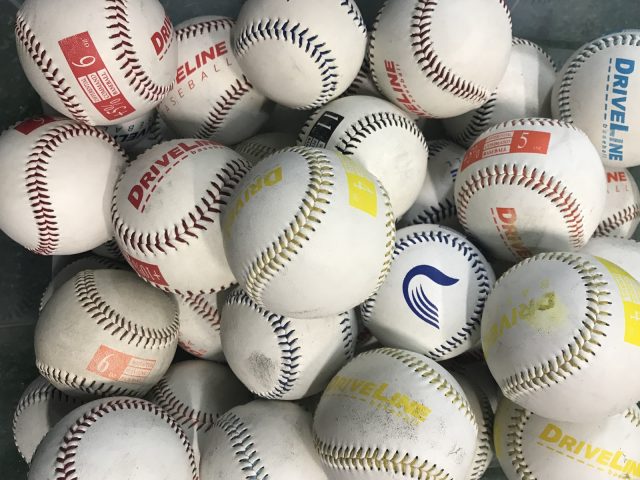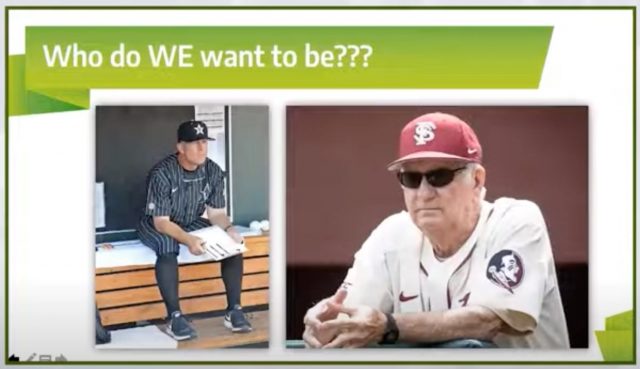반복으로 둔해지는 감각
우리야구 9호 특별판 “킬로미터” 5장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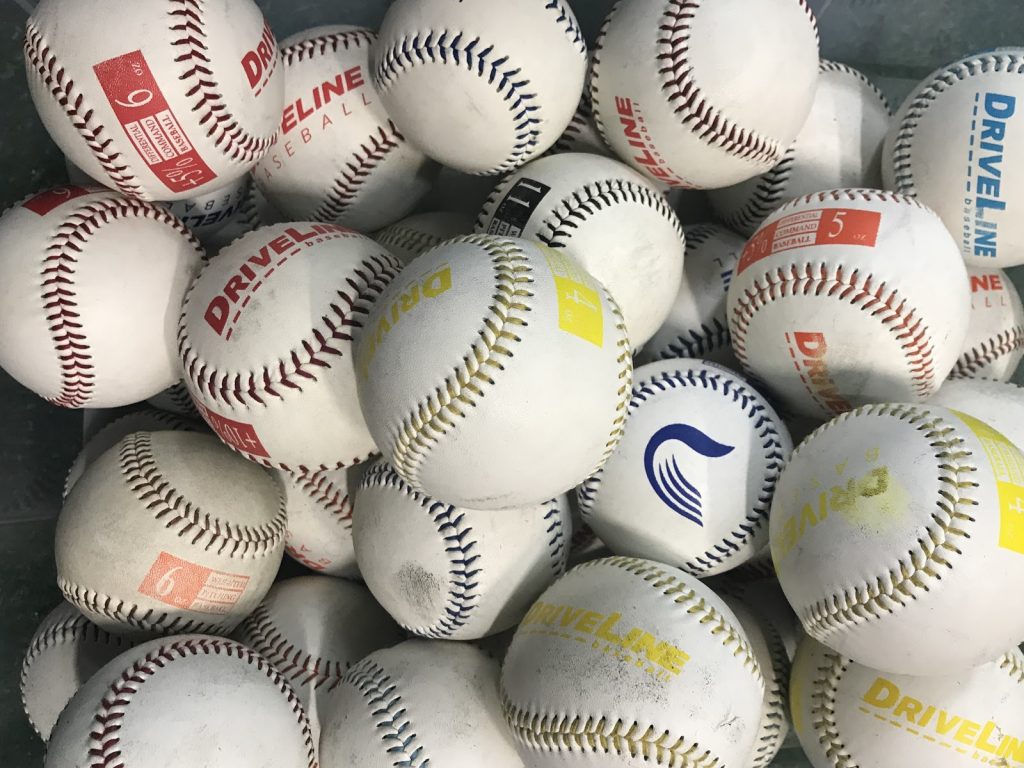
다케다 고교의 투수들은 연습에서 무게와 크기가 다른 다양한 공을 활용한다. 제구력이 나쁜 투수에게는 야구공보다 작은 공을 던지게끔 한다. 그것을 졸업할 때까지 하니까 3년간 쭉 다양한 공을 던지면서 공을 제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의미 포화’(Semantic satiation)라는 것이 있다. 일본 문화의 영향으로 게슈탈트 붕괴라는 말이 더 알려져 있지만, “단어처럼 형태가 고정된 신호가 반복적으로 전달될 때 신호에 대한 반응이 일시적으로 둔감해지면서 의미가 추출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스포츠에도 적용된다.
야구는 투수든 타자든 수비수든 대부분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특히 투수는 어릴 때 몸에 익힌 투구폼이 성인이 되어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경기에서도 연습에서도 같은 투구 동작을 무한 반복한다. 그것을 통해 안정된 투구폼으로 던질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미 포화’ 현상처럼 감각이 둔해지며 작은 변화에도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운동학습 분야를 탐구하고 있는 유제광 동국대 교수는 “야구공을 던지는 게 전문인 투수라고 해도 다양하게 던지는 방법을 경험해야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어느 종목이든 뛰어난 선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기량을 발휘한다. 특히 매일 똑같은 조건에서 던지는 것 같지만 야구에서 투수는 항상 다른 환경에 직면한다. 구장마다 마운드 높이도 미세하게 다르다. 밟는 흙의 강도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날의 기온, 바람, 습도 등도 제각각이다. 마운드 상태도 이닝을 거듭할수록 발을 내디디는 쪽이 파여 높이도 달라진다. 몸 상태도 날마다 다르다. 그런 환경의 차이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양한 경험에서 온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공을 던져봐야 한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서 항상 똑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없다. 그런데도 투수는 같은 투구 동작을 반복하게끔 한다. 그런 강제 속에서 환경에 미세한 변화라도 생기면 대응 방법을 몰라 헤맨다. 심할 때는 움직임에 오작동이 생겨 터무니없는 폭투를 저지르는 등 입스를 겪는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해 동작이나 기술을 수정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고교야구에서 투수가 홈런이라도 치면 언론매체는 ‘한국판 오타니의 탄생’을 부르짖는다. 그런데 과거에는 에이스가 4번 타자를 겸하는 사례가 너무 흔해서 큰 뉴스가 되지 않았다. 고교야구의 마지막 황금기를 장식한 박노준, 광주일고 시절 천재로 불린 박준태, 프로야구 첫 30(홈런)-30(도루)를 달성한 박재홍, ‘두목곰’ 김동주 등 끝없이 나열할 수 있다.
그처럼 흔한 에이스 겸 4번 타자가 생소하게 된 것은 2004년부터다. 고교야구에 지명타자 제도가 생긴 것이다. 투수의 전문화와 선수 한 명이 더 경기에 뛸 수 있다는 현장 지도자와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중학교 야구에도 지명타자 제도가 도입됐다.
유제광 교수는 “다양하게 던져보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포지션을 경험하는 것도 선수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한다.
한때 우리 사회는 ‘하나만 잘해도 성공한다’는 신화에 휩싸인 적이 있다. 이것을 야구로 빗대면, 투수는 공만 잘 던지면 된다는 것. 하지만 공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과학은 말하고 있다.
우리야구 9호 특별판 “킬로미터” 구입은 👉🏽 우리야구스토어
우리야구협동조합 회원에게는 무료로 배송됩니다.